미·중, 기술·데이터 확보로 '격차 확대'
로보택시, 안정·규제·신뢰 위한 필수경로
현대차그룹, 데이터 확보 해외합작 추진
"정부 지원없인 한국형 자율주행 난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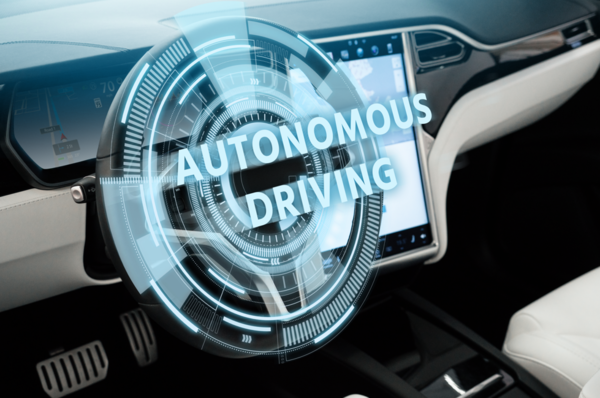
미·중이 자율주행 상용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그룹이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확보와 글로벌 로보택시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해외 기술 모방보다 국내 도심 구조와 사회적 특성에 맞는 '한국형 자율주행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Xpeng)은 자체 개발 AI칩 '튜링(Turing)'을 탑재한 로보택시 3종을 내년 선보일 계획이다. 샤오펑은 튜링 칩 4장을 장착해 초당 3000회 연산이 가능한 '피지컬 AI 2세대 시각·언어·행동(VLA)'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으로 회사 측은 연산력과 실도로 학습 데이터 측면에서 자율주행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미국 알파벳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Waymo)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웨이모는 지난 2020년 애리조나주 피닉스 지역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로보택시 시범 운행을 시작한 데 이어 현재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로 운행 지역을 넓혀가고 있다.
해외 기업들이 로보택시 상용화에 주력하는 이유는 기술적 안정성과 규제 대응, 신뢰 확보 측면 때문이다. 개인용 완전자율주행차(FSD·레벨4~5)는 운전자의 경로, 날씨, 교통 상황 등 변수가 무한해 고도화된 AI가 필요하지만 로보택시는 특정 지역(지오펜스·Geofence) 내에서 도로·신호·교차로 패턴을 학습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운행할 수 있다.
또한 각국 규제기관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개인용 자율주행차에는 허가를 꺼리지만 로보택시는 운행 구역과 시간 등을 한정해 실증형 허가가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도 로보택시 운행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하면 이후 개인용 완전자율주행차로 확장하기 용이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로보택시를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필수 경로'로 보고 있다.

다소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 국내 자율주행 산업도 글로벌 협력과 AI 인프라 확충으로 재도약을 준비 중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엔비디아의 차세대 AI칩 '블랙웰(Blackwell)' 기반의 AI 팩토리 도입을 추진하며 협력 강화를 발표했다.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해 자율주행 정밀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GPU 5만 장을 확보해 테슬라 다음으로 업계 2위 수준의 학습 역량을 갖출 전망이다.
현대차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 포티투닷(42dot)을 완전 편입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전환을 본격화했으며 2028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 모델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로보택시 분야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양대 생태계와 협력하며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미국에서는 웨이모·모셔널과 협력해 아이오닉5 기반 로보택시를 개발하고 시범 운행 중이며 중국의 샤오펑·바이두·모멘타 등과는 자율주행 AI 학습, 실도로 데이터 검증, 차량-사물 통신(V2X) 기술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안전 인증 체계, 중국은 방대한 실도로 데이터와 정부 인프라 지원이 강점으로 꼽힌다. 현대차는 이들 양대 시장의 장점을 흡수하며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완전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도심형 특화 전략으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재 한국의 자율주행 누적 실증 주행거리는 72만km로 웨이모(1억6000만km)와 바이두(1억1000만km)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국가별 도로 환경에 따라 접근 방식도 다르다. 미국은 고속도로형 자율주행,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실증 중심이라면 한국은 보행 밀집형 도심 구조에 최적화된 정밀 주행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자가용 중심의 자율주행에서 벗어나 좁고 복잡한 도심, 정류장 기반 교통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자율주행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내는 자율주행 관련 규제가 '포지티브(허용되지 않은 것은 금지)' 방식이라 실제 도로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현대차그룹이 미국 등 규제 완화 국가에서 실증과 합작을 확대하는 이유도 이 같은 기술·데이터 격차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은 미래 먹거리이자 미래 모빌리티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기업 차원의 100억~200억원 규모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크다"라며 "빅데이터가 부족하면 외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개인정보 보호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최소 수천억~수조원 규모로 지원해 한국 도로 환경에 맞는 데이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경제신문 김성하 기자 lysf@seoulmedia.co.kr
관련기사
- [Ψ-딧세이] 학교의 경계를 넘어 : GPT와 행렬 바깥에서 놀기
- 삼성-SK와 협력 넓히는 ASML···韓서 반도체 '신동맹' 구축
- [분석] 오픈AI 건강 비서, 헬스케어 AGI로 진화할 수 있을까
- 브레이크 없는 재생에너지 질주···원전 줄줄이 멈추며 전력수급 ‘비상등’
- 다카이치 발언 후폭풍···中·日 외교 갈등 넘어 여론전 '격돌'
- 삼성전자, 메모리 부족 '열쇠' 개발 완료···'포스트 HBM' 시대 선두
- "기술 변화는 폭발적, 규칙은 구식"···AI 시대 경쟁정책 '재설계' 필요
- [분석]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LIG넥스원, 주가는 급락한 역설 왜?
- 올해 수출 1위 국산 자동차는 트렉스, 내수 1위는?···올해 자동차 수출 596억 달러 ‘역대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