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텐센트 딥시크 통합···AI 자립 시도
세계 기업 정부 기관 딥시크 보이콧 선언
中 문샷 AI, 올해 1월 기업가치 33억 달러
"딥시크, GPT 벤치마킹한 양산 모델일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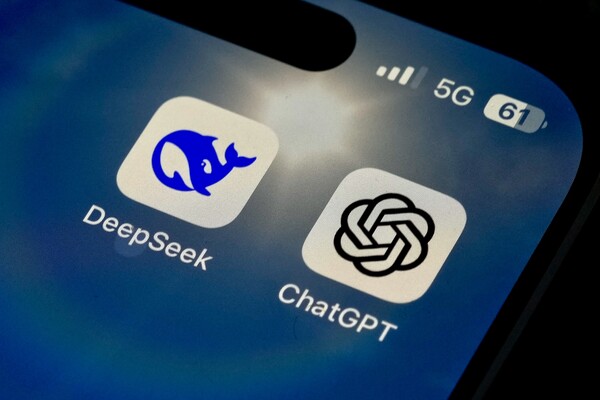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인공지능(AI)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각국의 통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중국은 AI 자립도를 높여 '자급자족' 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화웨이 클라우드 사업부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AI 인프라 스타트업 실리콘플로우(SiliconFlow)와 협력해 자사 어센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딥시크의 대규모 언어모델 V3와 추론 모델 R1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화웨이는 "딥시크 AI 모델을 보다 효율적이고 저렴한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글로벌 프리미엄 그래픽처리장치(GPU)에서 실행되는 딥시크 모델과 동일한 성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거대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게임업체 텐센트도 자사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에 딥시크 R1을 탑재했다. 텐센트는 "개발자가 3분 이내에 앱 설정을 완료할 수 있을 정도로 간편하다"고 홍보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도 R1을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 AI 파운드리(Azure AI Foundry)'와 개발자 도구 '깃허브(GitHub)'를 통해 제공한다고 발표했으며 아마존웹서비스(AWS)도 R1 모델 제공을 시작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딥시크 쇼크' 이후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딥시크 보이콧'이 확산하자 이에 대응해 중국이 AI 독립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30일 전 세계 기업과 정부 기관들이 딥시크 AI 챗봇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텍사스 주정부는 공공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으며 대만 정부 역시 각 부처 및 기관에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푸총 주유엔 중국대사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딥시크가 불러온 글로벌 반향은 미국의 대중국 기술 봉쇄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금지나 폐쇄가 아니다"라며 "화웨이와 틱톡을 보라 이제는 딥시크 차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바른 접근법은 미국의 개방과 협력이며 이는 기술뿐만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라며 "분열은 위험을 키우고 이익을 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푸 대사의 이러한 자신감은 중국 내 AI 성장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20일 딥시크가 R1을 공개한 지 불과 2시간여 만에 문샷 AI가 발표한 AI 모델 '키미 K1.5'가 전 세계 AI 개발자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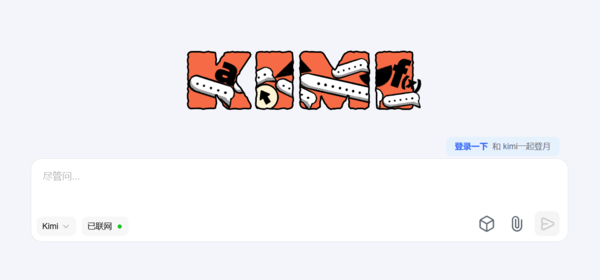
문샷 AI 측은 키미 K1.5가 오픈AI의 차세대 모델과 견줄 만한 성능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문샷 AI는 2023년 칭화대 출신 양즈린(34)이 설립한 기업으로 그는 졸업 후 미국 카네기멜런대(CMU) 언어 기술연구소(LTI)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츠에 따르면 문샷 AI의 기업가치는 올해 1월 기준 33억 달러에 달한다.
이 외에도 문샷 AI를 포함한 '6마리 작은 호랑이'로 불리는 주요 중국 AI 스타트업들이 있다. △문샷 AI △즈푸 AI △미니맥스 △바이촨즈넝 △링이완우 △제웨싱천 등이 이에 해당하며 딥시크는 오히려 후발주자로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알리바바·텐센트·바이두 등 중국 대형 IT 기업들도 잇따라 AI 대형 모델을 출시하며 기술 업데이트를 서두르고 있다. 이는 중국 인터넷 기업 자본력과 인적 자원이 AI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AI의 급성장에 맞서 미국 주도의 AI 기술 경쟁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딥시크에 대응하듯 새로운 AI 도구 '딥 리서치(Deep Research)'를 3일 공개했다.
오픈AI는 도쿄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딥 리서치는 사용자를 대신해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차세대 AI 에이전트"라며 "딥시크의 R1 모델보다 약 3배 높은 정확도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정보의 불확실성을 정확히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재성 중앙대 AI 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중국이 딥시크 모델을 자국 대기업들과 협력해 탑재하는 것은 AI 자립도를 높이려는 시도지만 정부 주도의 산업 구조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이 보이콧해도 중국 내에서는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AI 개발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딥시크 사례는 미국의 AI 패권 독점 구도에 균열을 일으키며 한 방 먹인 격"이라면서도 "GPT가 프로토타입(시제품)이라면 딥시크는 이를 벤치마킹해 저비용으로 구현한 양산형 모델에 불과해 글로벌 AI 패권에서 미국의 우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