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재의 동서고금]
로맨스로 개발 프로토콜 라우터 시스코 창업
상장 시총가 2억2400만달러 10년 후 80배
버블로 5460억달러 육박→붕괴 764억달러
성장 희망 자양분에 주가 성장→매출이 좌우
‘닮은 엔비디아’ 관건은 매 분기 실적·성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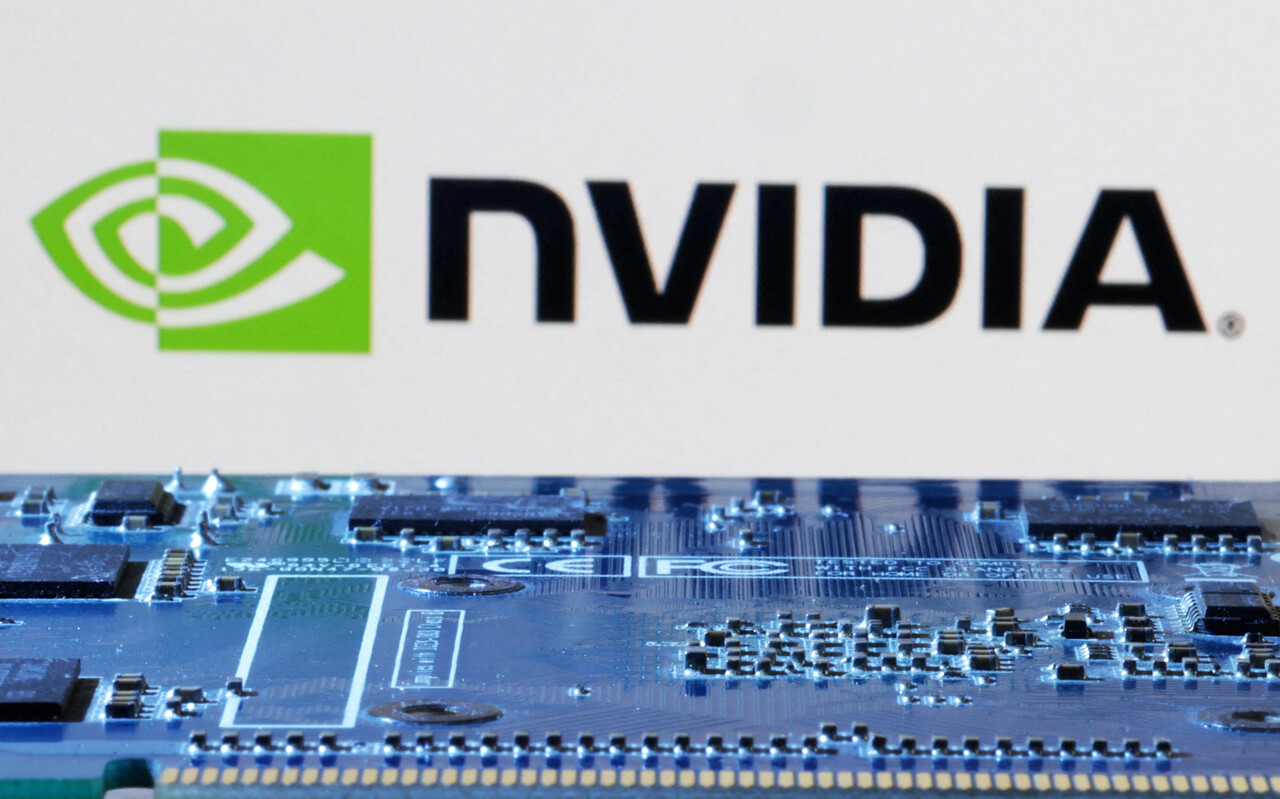
1990년대 초만 해도 컴퓨터는 사치재였다. 타자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문서 작성과 손쉬운 인쇄를 지원하는 컴퓨터의 역할은 훌륭했다. 엑셀이 출시되고 복잡한 수식 연산에 적용하면서 컴퓨터는 사무실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 컴퓨터는 각각 독립된 채 따로 놀았다. 한 컴퓨터에서 하던 작업을 다른 컴퓨터에서 수행하려면 얇고 둥근 80 킬로 바이트 용량의 플로피 디스크로 파일을 카피해서 옮겨야 했다. 플로피 디스크는 열에도 약하고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손상되었다.
공용 컴퓨터로 작업한 내용을 디스크에 저장했다가 손상을 입어 날려먹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데이터 손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미국 캘리포니아의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이미 랜(LAN) 선을 통해 자료를 공유하고 라우터를 이용해 컴퓨터 상호 간에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스탠퍼드의 라우터 혁명에는 당시 컴퓨터공학과 대학원생이었던 레너드 보색(Leonard Bosack)과 경영대학 컴퓨터 랩의 운영책임자였던 샌디 러너(Sandy Lerner)의 공헌이 절대적이었다. 여기에는 두 사람 사이의 로맨스가 한몫했다.
이 둘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도중에 얼굴을 보지 않고 전화를 하지 않고도 이메일로 조용하게 서로 안부를 묻고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다중 프로토콜 라우터를 개발했다. 그런데 스탠퍼드에서 라우터의 상용 판매에 대한 허가를 얻지 못하자 대학을 떠나 창업을 했다.
이 회사가 바로 시스코(Cisco)였다. 이들이 사랑하던 도시 샌프란시스코를 본떠 지은 이름이었다. 그들의 선택은 적중했다. 1986년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라우터는 불티나게 팔렸다. 매출 대비 이익률도 20%가 넘었다.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언제나 자금 부족이었다. 이들도 만성적인 현금 부족에 시달렸다.
시스코는 결국 잘나가던 벤처캐피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조건은 경영권 양도였다.
새로운 CEO로 존 모그리지(John Morgridge)가 왔다. 그는 스탠퍼드에서 MBA 학위를 받은 전문경영인이었다. 개발자였던 보색과 MBA 출신 모그리지는 의견이 맞지 않았다. 이사회의 반대로 보색과 러너는 회사를 떠났다. 창업자가 회사를 떠났지만 시스코는 승승장구했다.
더 넓은 시장을 지향한 모그리지의 마케팅이 통했다. 시스코는 1990년 2월 나스닥에 주식을 상장했다. 상장 당시 시가총액은 2억 2400만 달러였다. 이후 M&A를 통해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탄탄대로를 걸었다. 모그리지가 CEO 자리에서 내려온 1995년 총매출액은 19억 달러에 이르렀고 2000년에는 180억 달러에 달했다.
인터넷 혁명으로 컴퓨터와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스코의 성장성은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닷컴버블이 한창일 때 시스코의 시가총액은 5460억 달러에 육박했다. 창업한 지 불과 15년 만에, 상장한 지 10년 만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가 되었다. 신규상장 이후 주가는 무려 2430배나 올랐다.
모그리지를 뒤이어 시스코의 CEO가 된 전문 경영자 출신 존 체임버스(John Chambers)는 월가 최고의 스타였다. 시스코의 주가가 정점에 올랐을 때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매출액의 30배에 달했고 순이익의 196배에 이르렀다. 2000년 닷컴버블이 붕괴하고 시스코 주가는 폭락했다. 2002년 9월 시가총액은 764억 달러로 하락했다.
주가가 고점 대비 85% 넘게 급락했다. 그렇다고 하여 시스코가 망한 것은 아니었다. 매출액은 2007년 400억 달러를 돌파했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7년에는 5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금년 연간 매출액은 572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최근 시가총액은 2,030억 달러 내외에 머물러 있다. 주식은 16배의 PER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이 매출액의 3.5배에 불과한 상태다.

주가는 미래 성장성이라는 희망을 자양분 삼아 상승한다. 성장성의 잣대는 매출액이다. 매출액의 증가는 회사가 몸담고 있는 산업의 성장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닷컴버블이 붕괴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1990년대의 인터넷 혁명에 비교할만한 큰 변화가 예상된다.
AI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1990년대 시스코의 성장성에 비견될만한 회사가 엔비디아(Nvidia)다.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은 그래픽과 비디오 편집에 광범하게 적용되는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다. GPU는 컴퓨터 중앙처리장치인 CPU와 달리 병렬 연산이 가능해 게임과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2017년 이전까지만 해도 GPU의 성장성에 크게 주목하는 이는 많지 않았다. 당시까지 GPU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한 자릿수 정도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1993년 단돈 4만 달러로 엔비디아를 창업한 젠슨 황(Jensen Huang)의 비전은 달랐다. 그는 당시 서서히 성장하던 비디오 게임에 주목했다. 진일보한 그래픽카드의 개발에 전력투구했다.
창업 초기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의 사업 전망은 적중했다. 1999년 최초의 GPU에 해당하는 GeForce 256을 출시하면서 성장의 본궤도에 올랐다. 그해 주식을 나스닥에 상장했다. 신규상장 당시 시가총액은 6250만 달러에 불과했다.
이후 엔비디아의 성장세는 무서웠다. 2000년에 매출 10억 달러를 달성했다. 2007년 매출은 42억 달러로 늘어났고 2016년 90억 달러로 성장했다. 최근 이 회사의 매출액은 609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순익은 341억 달러를 시현하고 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2030년까지 연평균 35% 성장해서 매출은 1920억 달러에 달하고 순익은 1000억 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고 한다. 현재 시가총액은 2조 2600억 달러로 상장 당시보다 3만 6000배 상승했다.
만약 닷컴버블 당시 시스코의 주가매출비율(PSR) 30배를 적용하면 현재의 시가총액과 비슷한 규모가 산출된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순이익 마진율이 매우 높은 회사다. 2000년 시스코의 PER인 196배를 적용할 경우 시가총액은 현재보다 3배 정도 높은 6조 6800억 달러가 나온다. 현재 이 회사 주식의 PER는 70배 안팎이다.
과연 엔비디아는 2000년 시스코와 같이 주가의 정점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향후 수년간 더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까? 관건은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성장성 전망에 부응할지 여부다. 과거 시스코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세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가는 급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매 분기 주요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을 면밀히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성재 퍼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종합금융회사에서 외환딜러 및 국제투자 업무를 담당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예금보험공사로 전직해 적기 정리부와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2005년 미국으로 유학 가서 코넬대학교 응용경제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루이지애나주립대에서 재무금융학으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대학에서 10년 넘게 경영학을 강의하고 있다. 연준 통화정책과 금융리스크 관리가 주된 연구 분야다. 저서로 ‘페드 시그널’이 있다.
관련기사
- [김성재 칼럼] 닷컴 버블과 닮은 AI 열풍···기업 실적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
- [김성재 칼럼] 황제의 나라 중국의 ‘과거 회귀’ 반도체 경쟁서 미국에 패배할 이유
- [김성재 칼럼] 반도체 전쟁 승기 잡은 엔비디아·TSMC, 수세 몰린 삼성전자
- [김성재 칼럼] 자본시장과 이민자, 미국 경제의 강철검···아킬레스건은 물가
- [김성재 칼럼] 고금리 장기화와 중동전쟁, 미국 자본시장 붕괴 그림자
- 뚜껑 열리는 미국 빅테크 기업 실적···중동 불안 10% 급락한 엔비디아 어디로
- [김성재 칼럼] 바이든의 양 날개, 재닛 옐런-제롬 파월
- ‘엔비디아 특급열차 탄 동학개미 바글바글’···해외증권 투자 2월만 12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