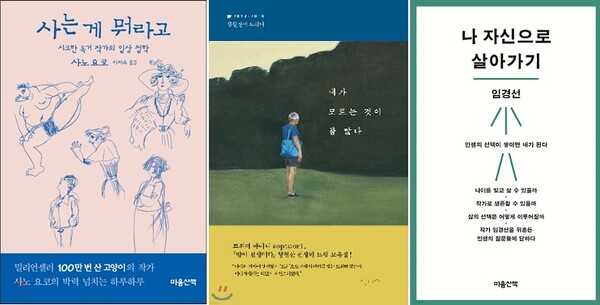스스로를 좋아한다는 것
객관적 인식과 자기 의심
자신의 완성을 향하는 일
책에서 읽은 것을 잃지 않고자 필사를 합니다.
책 속에서 제가 느낀 감정(feel)과 생각(思)을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사는 게 뭐라고』 사노 요코, 마음산책, 2015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 황현산, 난다, 2019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임경선, 마음산책,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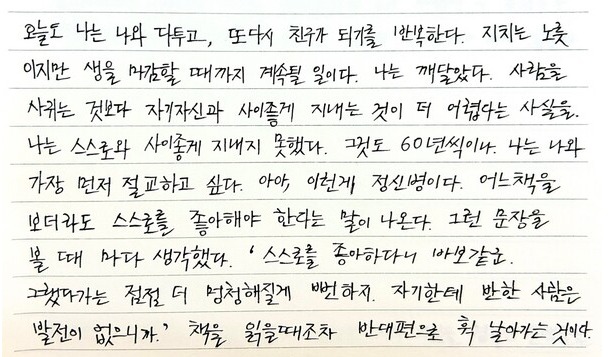
나는 나 자신과 잘 지내고 있을까? 일에서 실수가 있거나 바보 같은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난 뒤 후회할 때,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 할 때 내 자신이 싫다.
또 누군가 나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가시를 바짝 세우곤 하는데 그 태도 역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상대방은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겠지만 어떤 한 마디는 마음에 콕 박힌다. 흘려보낼 말은 흘려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끙끙 앓는다.
참는다. 내가 고쳐야 할 점이라면 고치는 게 마땅하니까. 상대에게 반박도 못 하고 그렇다고 개선 의지도 없는 이런 내가 싫어 거울을 쳐다보기도 싫다.
사노 요코도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게 가장 어렵다고 했다. 당시 70세였던 작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아하니 아무래도 나 역시도 죽을 때까지 나 자신과 잘 못 지낼 것 같다.
스스로를 좋아한다는 건 무엇일까.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 ‘자기애’가 충만한 사람이 무엇을 해도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것 같다. 부러움을 잔뜩 머금은 눈으로 쳐다보곤 한다. 물론 ‘자기애’의 부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자기애를 일컬어 ‘나르시시즘’이라고 한다. ‘자기애’가 넘쳐흐르는 것을 부정적으로 일컫는 것인데 과연 어느 정도의 자기애는 필요하지 않을까? 자신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을 애정하는 사람이 삶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삶뿐 아니라 모든 관계에 있어서 온전한 감정들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시작은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오늘도 질문이 꼬리를 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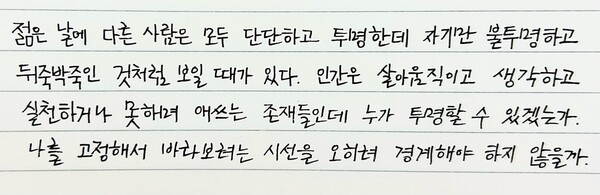
돌아가서 나 자신이 싫은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면 친구들이나 또래의 사람들은 나이에 맞는 그 단계를 밟아가며 삶을 꾸려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을 때다.
고 황현산 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젊은 날 다른 이들은 단단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러지 못할 때, ‘누가 투명할 수 있겠어.’라는 받아들임의 자세를 말씀하셨다. 나아가다 보면 조금은 내 자신이 좋아질 수도. 그럴 수도 있겠지. 라며 사노 요코의 자기 부정적 마음에서 조금은 달리 생각을 해본다.
그렇다고 행동 없이 그 자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일. 구태의연한 자신과의 거리를 둔 채, 직시할 줄 아는 힘을 기르고 싶다. 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자꾸만 ‘-싶다’하는 내가 또 싫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은 키워보자고 내 어깨를 내 손으로 스스로 다독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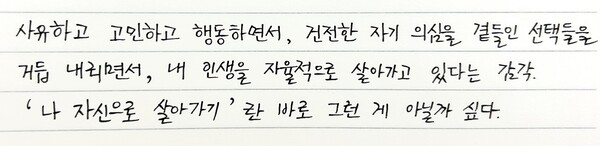
내가 내린 자기 평가는 자존심만 있고 자기애와 자존감은 일도 없는 상태라는 것. 이에 해답을 준 것은 임경선 작가.
작가의 말대로 고민과 행동의 반복에 비례하여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반추해 보고 건전한 자기 의심을 곁들인 선택을 해 나가 보는 것이다.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를 쌓으면 주체적인 삶이 될 것이라며.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에 집중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Perfect yourself first.’ 데일 카네기의 말이다.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자기 계발 서적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한 문장이 모든 것은 자신을 완성한 다음의 일이라니. ‘완성’이라는 단어가 불가능한 단어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들면서도 지향점으로 삼고 그저 실천하고 숙고하며 살면 미완의 존재에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내가 싫은 나에게, 나를 사랑하는 여정을 시작하며.
The Journey has just beg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