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재의 국제금융 인사이트]
기축통화국은 산업과 금융 경쟁력 그리고 국부가 결정
원화, 주요 통화 되기 위해 경제와 금융경쟁력 강화해야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 밤의 아래쪽이 하얘졌다’로 시작되는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雪國)’의 묘사는 생생하고 서정적이다. 터널은 두 세상의 단절을 시사하지만, 흰 눈의 나라는 새로운 세계가 눈 앞에 펼쳐지고 있음을 뜻한다.
첫눈이 내려 그동안 친숙했던 모든 색상의 세상을 가려버리고 단색의 하얀 풍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을 때, 사람들은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회상에 잠긴다. 그것은 마치 꿈꾸던 동화 속 장면의 강렬함이 실존의 세상 속 삶 안으로 내려온 듯한 느낌이다.
또한, 그것은 아마도 변방 어느 한 나라의 돈이 어느새 갑자기 세계 기축통화가 되어 있을 때 그 나라 국민이 느꼈음직한 감정과도 비슷할 것이다. 해외에 나가서도 평소 국내에서 사용하던 그 돈으로 물건을 사고 무역을 하면서도 초강대국 국민이라 대접까지 받는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이런 이유로 세계사는 기축통화국이 되려는 열강의 쟁투로 얼룩져 있다. 15세기 첫 번째로 세계 기축통화의 반열에 오른 것은 스페인의 페소화였다. 1492년 이사벨라 여왕 등의 도움으로 콜럼버스가 카리브 제도 바하마 섬에 도착한 이후 스페인 정복자들은 약탈과 노획을 일삼았다.
에르난 코르테스는 1519년 600명의 병력으로 인구 20만이 넘는 아즈텍 제국의 수도를 점령하고 황금을 약탈했다. 또한, 1533년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인구 1200만 명의 잉카 제국을 정복하고 파괴한 뒤 엄청난 양의 금과 귀금속을 노획했다.
스페인 사람들은 오랜 문명을 파괴하고 약탈했지만, 황금에 눈먼 그들에게는 성에 차지 않았다.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의 전설에 골드러시가 가세하면서 금광과 은광을 찾으려 혈안이 되었다. 이들은 마침내 안데스산맥의 해발 4000미터가 넘는 하늘 아래 첫 동네인 볼리비아의 포토시(Potosi)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은광을 발견했다.
순은으로 다리를 놓으면 남미 대륙에서 대서양을 건너 유럽에 이른다는 6만 톤에 이르는 은을 채굴하기 위해 총 8백만 명의 현지 광부들이 죽어갔다. 그러나 이곳에서 유입되는 엄청난 양의 은화를 바탕으로 스페인은 역사상 최초로 세계제국을 건설했다.
그런데 대규모로 은화가 유입되면서 스페인은 물가 상승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생산량이 정해진 상태에서 돈의 양이 증가하면 생산된 물건의 값은 치솟을 수밖에 없다. 국내 물가가 오르자 스페인인들은 물가가 상대적으로 싼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스페인의 경상수지에 적자가 누적되면서 페소화는 유럽 전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그리고 식민지였던 아메리카와 필리핀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세계 기축통화가 되었다. 스페인의 페소화는 네덜란드의 길더화 등과 더불어 18세기까지 기축통화의 지위를 지켰다.
19세기 이후 세계 기축통화의 지위를 계승한 것은 영국 파운드화였다. 산업혁명 이후 막강한 국제 경쟁력을 바탕으로 스페인에 이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건설한 대영제국은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1816년 영란은행은 공식적으로 금본위제(gold standard)를 도입했다.
파운드화의 가치가 금과 연동되고 다른 나라들도 이를 뒤따르자 파운드는 글로벌 통화로서 환율 산정의 기초자산(base currency)이 되었다. 전 세계 무역의 60%가 파운드로 결제되었고 런던은 금융과 보험의 센터가 되었다. 1890년 ‘72일간의 세계일주’로 유명해진 미국인 넬리 블라이(Nellie Bly)도 당시 여행에 파운드화를 지참하고 다녔을 정도였다.
그러나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파운드화의 영광도 영원할 수 없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전쟁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 각국이 통화 발행을 남발하면서 파운드 위주로 운용되던 금본위제가 지속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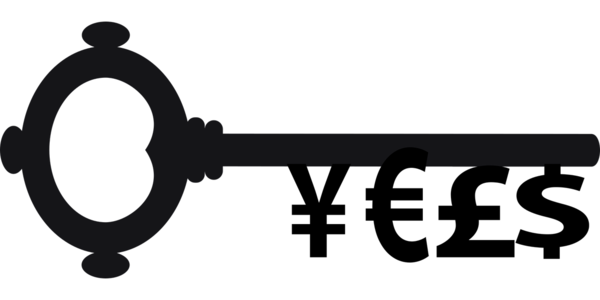
금본위제를 유지하려는 영국의 노력이 무산되면서 1930년대가 되자 세계 기축통화국의 지위는 20세기 들어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떠오른 미국으로 서서히 흘러갔다. 또한, 세계 2차대전으로 유럽의 산업기반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전후 미국 경제는 최강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의 브레튼우즈에서는 세계 기축통화(anchor currency)로서 달러화의 지위가 공식적으로 선언되었다. 달러화의 가치를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했고 다른 통화의 가치는 달러화와 연동되도록 했다. 달러를 중심으로 국제무역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전후 미국은 마셜플랜을 통하여 유럽의 부흥을 도왔고 한국, 터키를 비롯한 저개발 우방국들에 막대한 규모의 원조를 제공했다. 공산지역에 맞설 첨병으로서 일본과 서독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용인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달러를 전 세계로 공급해 금 대신 보유하도록 했다.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달러화의 가치에 의구심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마침내 더 이상은 달러를 금과 교환시켜 줄 수 없는 상태가 되자, 1971년 닉슨 대통령은 브레튼우즈 체제에 종말을 선고했다. 이로써 공식적인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역할은 끝이 났다.
그럼에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준비통화(reserve currency)로서 달러화의 위상은 여전히 굳건하다. 각국 중앙은행 외환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하고 외환 거래의 88%가 달러와 연계된다. 외국인이 달러로 발행한 채무규모는 12조 달러가 넘는다.
이런 달러의 지위는 미국의 강력한 산업 경쟁력, 세계 최대의 국부(國富) 규모, 그리고 뉴욕 등 국제 금융센터의 발전에 기인한다. 유로화는 탄생 당시 달러화의 지위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유로존은 위에 언급한 세 가지의 어느 한 분야에서도 미국을 앞서지 못한다.
1980년대 달러화의 지위를 위협하던 일본 엔화도 마찬가지다. 당시 일본의 산업 경쟁력은 미국과 견줄만했고 국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지만, 금융센터의 발전은 미진했다. 현재 달러 타도에 나서고 있는 중국의 위안화는 말할 것도 없다. 준비통화로서의 비중이 2%에 불과하다.
그나마 유로화와 엔화, 그리고 파운드화가 준비통화의 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위의 요건 중 한두 가지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유로존의 독일과 일본은 20세기 후반 세계 최고의 국제경쟁력으로 국부를 쌓았다. 영국의 런던은 세계 제1의 외환거래 금융센터다.
그렇다면 원화는 어떨까?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그 규모가 세계 10위이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불과하다. 국부의 규모와 외환시장에서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의 2% 안팎이다. 그런데 준비통화로 원화를 보유하는 비중은 0.2%에 불과하다. 원화가 주요 통화가 되려면 우리 경제의 비중을 두배 이상 키우고 금융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성재 가드너웹대학교 경영학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