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 조선 ‘미스터 트롯’에서 고재근(1977~ ) · 이찬원(1996~ ) · 김호중(1991~ ) · 정동원(2007~ )이 '패밀리가 떳다팀'을 구성해 관중들은 물론 시청자를 숙연케 했던 ‘희망가’는 1919년 3·1만세운동 직후에 식민지 조선 청년들 사이에서 나라 잃은 슬픔을 달래며 애창된 작사 · 작곡자 미상의 일본 번안곡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원곡은 18세기 영국의 무곡(舞曲)인데, 미국 남부에서 흑인들이 성가(聖歌)로 부르던 곡을 미국의 제레미아 잉갈스(Jeremiah Ingalls,1764~1838)가 채보하여 편곡한 ‘주님이 주의 정원에 오시니’(The lord into his garden comes)라는 찬송가이다.
주님이 주의 정원에 오시니 / 향료가 좋은 향을 내고 /백합이 활짝 피었네 / 백합이 활짝 피었네 / 주님이 은총을 듬뿍 내려 주시네 / 모든 포도나무에 은총을 내리시네 / 그리고 죽은 자를 되살리셨네 / 주님이 죽은 자를 되살리셨네
이 찬송가는 후에 1881년 ‘프랭클린 스퀘어 송’에 수록되었는데, 이 곡이 1890년대에 일본에 전래되어 ‘유메노 게’라는 학교 창가로 불리어졌다. 그런데 1910년 우리나라의 세월호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선박 침몰사고로 12명의 학생이 사망하자, ‘미쓰미 스즈코’라는 여교사가 이들을 추모하는 자작시에 이 곡을 붙인 진혼곡 ‘새하얀 후지산의 뿌리’라는 노래를 취입한 것이다.
같은 시기인 1910년 기독교도 임학천이 이 찬송가 곡에 식민지 시대 희망이 없는 암울한 심정을 작시한 가사를 붙여 ‘이 풍진 세상’이라는 곡을 발표하자 조선 청년들 사이에 널리 애창되었다. 이후 1921년 기생 출신의 민요가수 박채선과 이류색이 이 노래를 우리 고유의 전통 민요 창법으로 불러 훗도뽀루(훗볼, foot ball의 일본식 발음) 앨범에 취입하였는데, 앨범에는 장르를 ‘신식 창가’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 곡은 1922년 출간된 ‘최신 중등 창가집’에는 ‘일요일가’(日曜日歌)로 소개되었고, 1934년 출간된 ‘방언 찬미가’에는 ‘금주찬가’(禁酒讚歌)로 표기되는 등 시대적 니즈(needs)에 따라 당시 사회의 계몽적 메시지를 던지는 노래로 진화되었다.
이처럼 ‘이 풍진 세상’은 ‘희망가’ 외에도 ‘탕자 경계가’, ‘탕자 자탄가’, ‘청년 경계가’로도 불리어졌다. 이제 ‘희망가’의 가사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 희망이 족할까 /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 곰곰이 생각하니 / 세상만사가 춘몽 중에 / 또다시 꿈 같도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 희망이 족할까 / 담소화락에 엄벙덤벙 / 주색잡기에 침몰하랴 / 세상만사를 잊었으면 / 희망이 족할까
/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 곰곰이 생각하니 / 또다시 꿈 같도다 / 또다시 꿈 같도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 희망이 족할까
가사 중 ‘이 풍진(風塵) 세상’이란 바람에 날리는 티끌 같은 세상, 곧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지러운 일이나 시련을 가리키는 말이니, 일제강점기 암울했던 조선 청년들의 심정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세상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는 장자의 호접지몽(胡蝶之夢)을 연상케 한다. 꿈속에서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인가? 라는 무아무불아(無我無不我) 곧 내가 없으니 나 아닌 것이 없고, 무가무불가(無家無不家) 곧 내 집이 없으니 내 집 아닌 곳이 없는 셈이다.
담소화락(談笑和樂)에서 담소는 chat, friendly conversation, 화락은 peace and harmony가 원뜻이지만, 여기서는 최백호(1950~ )의 ‘낭만에 대하여’ 가사 중 ‘실없이 던지는 농담’과 격을 같이 하는 의미이다.
주색잡기(酒色雜技)란 술과 여자와 여러 가지 노름을 가리킨다. 원불교 정전(圓佛敎 正典) ‘보통급 십계문’ 중 연고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간통을 말며, 잡기를 말며, ‘솔성요론’의 주색 낭유하지 말고, 그 시간에 진리를 연구하라는 구절은 ‘희망가’의 계몽성과 궤를 같이 한다.
‘희망가’라는 곡명과 어울리지 않게 나라 잃은 설움이 묻어나는 현실 도피의 염세적 가사로 레이몬드 윌리엄스의 정서구조 분류에 따르면 지배적(dominant) 요소에 해당하는 절망가이다. 이런 연유로 유신 독재 체제 등 사회 분위기가 암울할 때마다 소환되던 노래이다.
이처럼 곡명도, 가사도, 장르도 동서고금을 초월하여 끈질기게 이어져온 ‘희망가’는 우리 민요 ‘아리랑’과 같이 민중들의 처지에 따라 가사를 고쳐서 불리어지는 민중가요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이 노래가 대중들에게까지 널리 애창되기 시작한 것은 1933년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 대중가수 채규엽(1906?~1949?)이 레코드에 재취입하면서 부터이다.
채규엽은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1928년 귀국하여 근화여자학교(덕성여고 전신)에서 음악을 가르쳤다. ‘희망가’ 외에도 ‘홍등야곡’, ‘술은 눈물이냐 한숨이냐’, ‘물새야 왜 우느냐’, ‘명사십리’, ‘시들은 청춘’ 등을 히트시켰으나 1948년 월북하였다.
한편 원곡인 ‘주님이 주의 정원에 오시니’에서 유래되어 다음과 같은 ‘서로 사랑하자’라는 복음성가가 나왔는데, 1967년 ‘인정 많은 아가씨’로 데뷔하여, 1975년 ‘쨍하고 해뜰 날’로 쨍하고 해가 뜬 송대관(1946~ )이 ‘주님과의 약속에도 서로 사랑하자’로 취입한 CCM 음반이 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 하나님은 곧 사랑이요 주 예수님도 사랑이라 /사랑받은 자 큰 증거는 온전한 사랑이라
사랑은 항상 오래 참고 또한 참으로 온유하며 /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네
/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또한 무례히 행동 않고 /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 하네 / 사랑은 남의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로 기뻐하네
사랑은 무슨 일이든 참고 또 범사에 믿으며 / 범사에 항상 바라면서 범사에 견디도다 / (후렴) /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 사랑의 주님 계명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한편 ‘희망가’는 야인시대 · 짝패 · 군함도 등을 비롯해 드라마 ‘경성 스캔들’, 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 등에 쓰였으며, 나훈아(1947~ ) · 한대수(1948~ ) · 장사익(1949~ ) · 이선희(1964~ ) · 김종서(1965~ ) 등 여러 가객들에 의해 불리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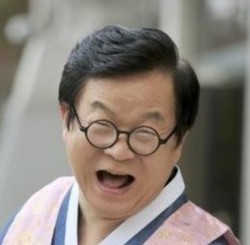
* 만담가 장광팔은...
본명은 장광혁. 1952년 민요만담가 장소팔 선생 슬하의 3남으로 서울에서 태어나, 우리나라의 전통 서사문학 만담과 대중가요 가사연구에 대한 글쓰기와 만담가, 무성영화 변사,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며, 남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에서 서사문학을 가르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