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취약계층 고용 현황 분석
청년은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고령층은 은퇴 후에도 생계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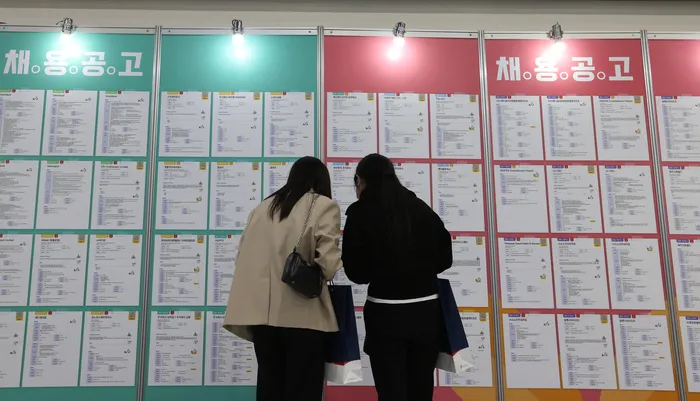
지난 10년간 한국의 고용 취약계층 가운데 여성 고용률은 가장 많이 개선됐지만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양'은 늘었지만 '질'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년·고령층과는 다른 고용 불평등의 역설이 드러난다.
23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14년 55.0%였던 여성 고용률은 2023년 61.4%로 6.4%p 상승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증가율(5.4%p)을 웃도는 수치로 외형적 개선 폭만 보면 고령층(4.2%p), 청년(5.3%p)을 상화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여성의 고용률 순위는 OECD 내 30위권에서 정체됐다.
문제는 여성의 고용이 주로 돌봄·서비스업에 집중돼 있으며, 저임금 일자리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저임금 여성 근로자 비중은 10년 새 37.8%에서 24.5%로 줄었으나 여전히 OECD 상위권(4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년층 역시 전일제 일자리 자체가 줄고, 시간제 종사자가 늘어나며 질적을 높은 일자리 기회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120만 명이던 청년 전일제 종사자는 2023년 80만 명으로 감소한 반면 시간제는 38만 명에서 56만 명으로 증가했다.
청년·여성의 고용률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달리 고령층(55~64세) 고용률은 지난 10년간(2014~2023년) 꾸준히 OECD 평균을 상회했다. 한국의 고령층 고용률은 2014년 65.7%에서 2023년 69.9%로 4.2%p 상승했고, 같은 기간 OECD 중상위권(7~16위)을 유지했다. 한경협은 "주된 직장에서 은퇴한 고령층이 생계유지를 위해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해야 하는 현상 때문"이라 해석했다.
한경엽 보고서를 종합하면 청년은 아예 출발선에 서지 못한 경우가 많고 여성은 저임금 직종에 몰려 경력 단절은 반복되는 구조였다. 정규직 진입 문턱은 높고, 첫 일자리조차 시간제나 단기직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다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고령층은 퇴직 이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이어가야 하고, 일자리의 질도 대부분 열악하다.어느 세대도 ‘일자리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안정되거나 기대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현실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내수경기 침체 지속으로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여성·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경제신문 이상헌 기자
liberty@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