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사건 4만 6496건···10년 새 53.3%↑
노인들 죽음 준비, 장례 절차만 신경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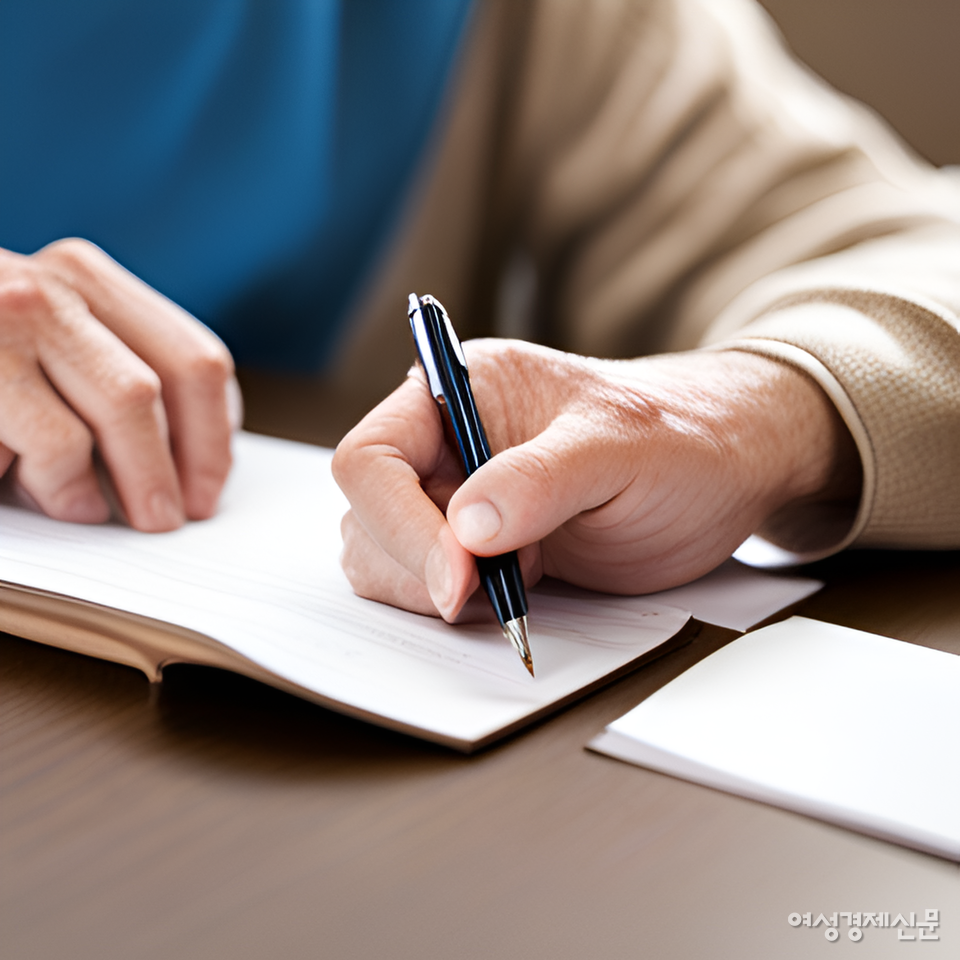
가정법원 단골 아이템이 바뀌었다. 10년 동안 집안싸움 1위 원인이었던 이혼소송 건수가 상속 분쟁에 밀려 순위 아래로 떨어졌다.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상속 분쟁이 사회 공동체 균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에선 지자체가 유서를 직접 관리하는 '유서 공적 관리 제도'를 도입하기까지 했다.
31일 여성경제신문이 대법원 사법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줄곧 사건 1위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던 이혼소송이 지난해 처음으로 4만5351건에서 3만2041건으로 줄었다. 다만 같은 기간 상속소송은 3만321건에서 4만6496건으로 53.3%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이양원 법무법인 부천종합 대표변호사는 "요즘 고령층은 '재산을 물려주면 인생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해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가족 간의 유대도 바뀌어 유산을 '배우자에게 전부 주기'에서 '자녀와 배우자 등 가족에게 동등하게 나누기'의 인식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인 가구 증가와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아파트 하나가 중요한 자산이 돼 상속 분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사건 대부분이 유서나 유언 없이 접수돼 분쟁이 까다로워지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통계를 보면 상속 사건 중 세부 분쟁으로는 '부동산 다툼'이 가장 많았다. 92.2%를 차지하면서 사실상 상속 사건은 가족 간 부동산 다툼인 셈이다. 문제가 생긴 기존 명의자가 사망할 때 '유서'나 '유언'을 준비하지 않고 사망해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법원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엔 상속 소송이 올라오더라도 그 내용에 사망자의 유언이나 유서가 증거로써 제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해결 과정이 수월한 편"이라면서도 "하지만 국내 사례의 경우 대부분 사망자가 일명 '떠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유언이나 유서 작성보다는 묫자리를 본다든지 등의 장례 절차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0년 발표한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의 죽음 준비 실태' 항목에서 '죽기 전 준비하는 항목'에 유서를 작성한다고 답한 노인은 전체 중 4.2%에 불과했다. 비슷한 항목인 '상속재산처리 논의'를 한다고 답변한 사례도 12.5%뿐이다. 반면 장례 절차를 준비한다고 답한 노인은 77%를 차지했다.
김미현 웰다잉연구소 대표는 "상속 분쟁이 늘고 있다는 건 가족 구성원 간 유대감이 파괴돼 결국 공동체 균열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얘기"라면서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선 마무리도 깔끔해야 한다. 미국은 성인의 56%가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국내는 통계조차 없다. 상속 유류분 항목만이라도 적는다면 상속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日 유서 공적 관리 제도로 분쟁 건수 ↓
유서 제도화로 가족 간 분쟁 감소 기대
일본은 상속 분쟁 건수를 줄이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유서 공적 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에 한해 지자체에서 보관한다. 전국 312곳의 보관소가 마련됐고, 이를 관리하는 유언서보관관이라는 공무원도 생겼다. 이를 통해 유서를 보관한 당사자가 사망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열람해 재산 상속과 관련된 항목이 있을 시 유서를 기반으로 재산 증여가 이뤄진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언 공적 관리 제도 도입 후 상속 분쟁 건수는 2년 새 38.2% 줄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지금도 자필 유서를 생전에 작성해 법무법인을 통해 보관하기만 해도 사망 이후 가족 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며 "이를 지자체가 제도화해 도입한다면 분쟁이 발생한다 해도 해결 과정에서의 가족 간 합의만큼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