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손해 발생 여부 중요
법적 증거 확보해야 유리
임금서 직접 차감은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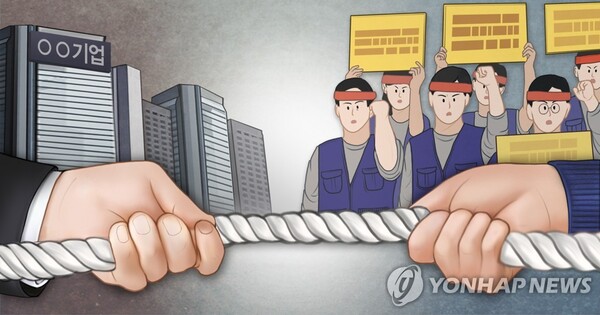
직원의 갑작스러운 무단결근은 중소기업 사장들에게 큰 타격이 된다. 거래처 약속이 틀어지고 생산라인이 멈추는 등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럴 때 사업주가 떠올리는 것이 바로 ‘무단결근 손해배상 청구’이지만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3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은 “단순히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관건은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무단결근과의 인과관계다.
예를 들어 대체 인력 투입으로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했거나, 납기 지연으로 거래처에 위약금을 지급한 경우, 혹은 생산 차질로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반대로 “업무에 불편을 줬다”거나 “기분이 나빴다”는 정도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손해배상 청구 절차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곧바로 소송에 나서기보다는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무단결근 사실과 손해 발생 내역을 알리고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 관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손해액 산정은 ‘나오지 않은 일수에 일당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손실을 기준으로 한다.
증거 확보는 승패를 가른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출근부·근태 기록 △대체 인력 투입 계약서·위약금 청구서 등 피해 자료 △퇴사 통보 및 대응 내역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무단결근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법적 판단에서 유리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임금 공제다. 사업주가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직접 차감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 신고 등으로 오히려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무단결근을 근태불량으로 간주해 해고 조치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무단결근은 무조건적인 해고 사유가 아니다. 상습성, 무단결근 일수, 결근의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해고 사유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다.
해고가 되면 사업주는 서면 통지의무, 30일 치 해고 예고수당 지급 의무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불만을 품은 직원이 작심하고 '부당해고'를 주장한다면 추가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직원의 무단결근은 기업 운영에 분명한 부담을 준다. 하지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철저한 증거 수집과 절차적 준비가 관건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무단결근 손해배상은 반드시 민사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마련인데 법적 요건과 한계를 정확히 아는 것이 불필요한 갈등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