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요양시설 20곳 신설
공동생활가정도 430곳 늘리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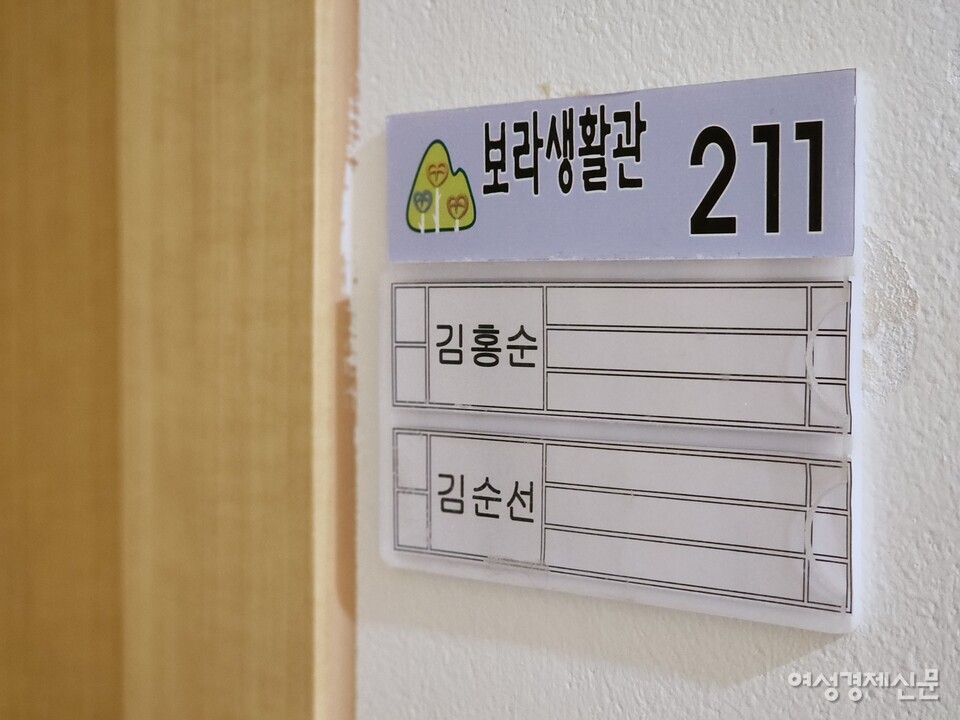
지난달 서울 강동구에 한 시립 요양 시설이 문을 열었다. 그 주인공은 강동실버케어센터. 센터는 이미 장기 요양 서비스 수요자로 만실을 기록했고, 현재는 입소 대기자가 100명을 넘어선다. 강동센터는 치매 전담 시설이다. 돌봄 로봇을 도입해 민간 시설보다 더욱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해 시설 이용 희망자가 늘고 있다.
같은 달 서울 가양동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운동장엔 잡풀이 자라났다. 아이들 손때가 묻은 놀이기구엔 녹이 슬었고, 교문엔 '폐쇄 안내문'이 붙었다. 근처에 위치한 문구점은 낡은 간판만 덩그러니 남았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으로 급증하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다. 합계출산율 0.78명 시대에 아이들이 찾는 교육 시설은 모습을 감추고 노인들이 찾는 요양시설이 되레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전국 노인 요양 시설 수는 3390곳. 2022년엔 4346곳으로 늘었다. 도심에서는 어린이집·결혼식장 등이 요양원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잇따른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2030년까지 구립 및 시립 공공 요양 시설 20개와 9명 이하의 안심돌봄가정(서울형 노인 요양 공동 생활가정) 430개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고령화로 인해 돌봄 및 의료 복지가 필요한 요양 등급 인정자가 늘어나고, 간병비 부담으로 요양 병원 대신 요양 시설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 요양수급 예정자는 대부분 국공립 시립 요양시설을 선호하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요양 등급 판정자 가족의 68%는 '민간 요양원 혹은 요양병원보다 국공립 시립 요양원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다 보니 신뢰도가 높고 비용 또한 저렴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선 시설 확충에 필요한 여러 제약을 해결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서울에서 요양시설을 만들 대상지 발굴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지 자체가 적고, 재원 확보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지역 주민 반대도 설득해야 한다.
서울에 사는 노인 장기 요양시설 급여수급자 2만4140명 중 공공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235곳)과 서울형 공동생활가정(258곳)에 입소한 고령층은 1만6742명으로 69.4% 수준이다. 이 가운데 시립 시설은 지난 5월 말 기준 11곳에 그친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원·영등포·송파에는 시립 공공 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추진 중이고, 서초·관악·광진에는 구립 시설 건립 사전 절차가 완료돼 설계 용역 등 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규모 공공·민간 개발사업에서 노인요양시설을 공공기여 등으로 우선 확보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일정 규모 이상 공공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노인요양시설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서울시가 300가구 이상 주택 정비사업에 요구하는 학교 부지를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공공 공지’로 기부채납 받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학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교육청이 요청하면 개발사업 초기 일부 땅을 학교용으로 분류했는데, 저출생에 따라 앞으로 학교 신설 수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반면 지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요양원 등을 기피 시설로 인식하지 않도록 문화·체육시설이나 키즈카페, 아동 치료센터 등과 결합한 설계도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동센터의 경우 잔디광장·중앙정원 등을 주민에게 휴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다. 이 밖에 자치구가 부지를 확보하면 건립비 전액을 서울시가 지원해 추진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